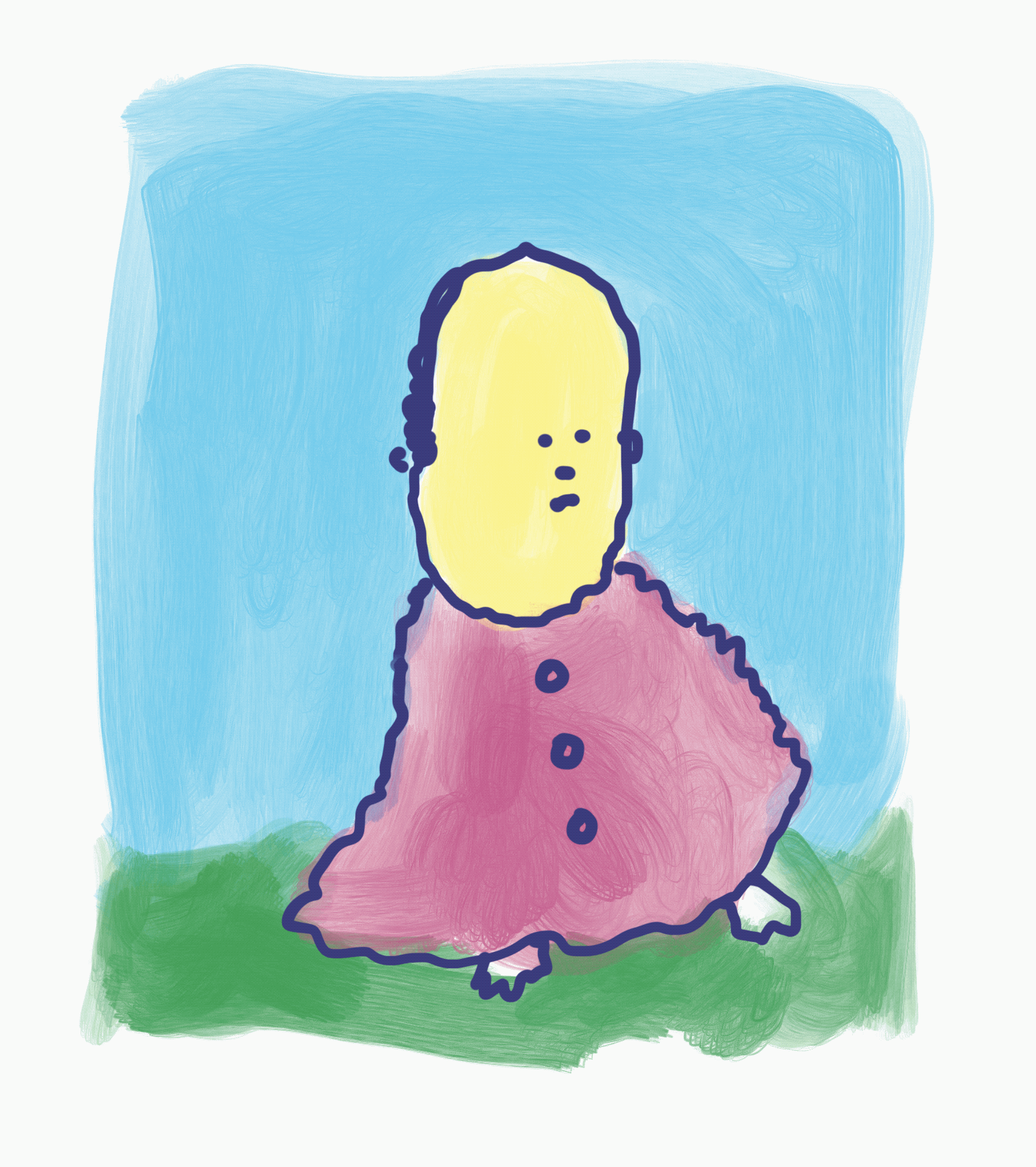1.
나는 괴물이 된 존재들에게 모종의 동질감을 느낀다. 내게 괴물이라는 개념은 규범적 질서 속에서 보편적 인간의 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미끄러진 몸들의 은유로서 존재한다. 서구 근대의 ‘위대 한 업적’ 중 하나인 이분법의 틀은 인간 이미지를 백인, 남성, 이성애자 등과 같은 좁고 협소한 위치들로 과잉 대표하는 동시에, 정상성을 입지 못한 신체들을 저급한 것으로, 비정형적인 것으로 외면하며 괴물의 영역으로 퇴출시켜 왔다. 그렇다면 합리성의 빛이 내리쬐는 양지바른 곳에서 쫓겨나 괴물이 된 존재들은 어디에 갈 수 있을까.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어둠 속에 남아 빛을 영원히 질투하는 형벌에 처하거나, 자본주의 시장의 특이한 상품이 되어 살아남는 길 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 관심하에 나는 괴물에 가까워 보이는 형상들을 만들고 이들을 회화 화면의 가상적 시공 간 속에 이주시키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이들은 주로 값싼 재료인 지점토를 사용해 충분한 상품성을 갖추지 못한 작은 오브제들로 만들어지거나, 회화 화면의 가상적 시공간 속에서 인간 규범과 초 월성을 흉내 내며 다양한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존재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괴물들은 귀엽고 유 머러스한 ‘상품’과 저급하지만 생명력을 가진 ‘쓰레기’라는 두 가지 존재 방식의 갈림길 사이를 계속해서 표류 하며 아이러니한 웃음들을 공유한다.
그와 동시에 나의 작업은 직접 ‘흙’을 만져 형상들을 만들고, 새로운 시공간 안에 그들을 위치 시켜 서사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세계관을 창조하는 ‘신의 놀이’를 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있기도 하다. 이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 존재에 대해 괴물적 존재가 품을 수밖에 없을 애증과 결핍으로부터 출발한 욕망이기도 하며 이상향적 대안을 갈구하는 몽상가적인 욕망이기도 하다. 물론 나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계는 기존에 존재하는 관습적 기호와 상징물들을 빌려와 불안정하게 쌓은 탑이며, 언제든 현실 세계에 자리를 내주고 막을 내릴 위험성을 내포한 일시적이고 가상적인 연극무대에 가깝다.
이 연극적 세계 속에서 괴물들은 못과 가시처럼 보이는 뿔들을 머리에 꽂아 저급한 형태의 광배 를 만들거나 날개를 달고, 태양, 별, 달과 같은 지상 위의 존재들을 흉내 낸다. 주체가 되어보고자 하는 괴물들의 노력은 그들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미끄러지며 우스꽝스러운 실패들을 낳는다. 그들이 발을 디디고 있는 시공간 또한 언젠간 필연적으로 허물어질 무대이다. 그리고 나의 관심은 그 지점에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할 이상향을 쫓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자아내는 멜랑꼴리한 웃음 그 자체와 그 웃음소리가 커졌을 때 그것을 무기로 사용해 신과 그의 아들인 인간의 얼굴에 작은 틈새를 만들어 그 선형적 욕망 속에서 탈주할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2.
2021 <한편 달나라에서는...> 전시 서문| 장유정 기획자
한편 달나라에서는…
2021. 7. 6 ~ 7. 30
이준희 개인전
“인간은 병들었지, 왜냐하면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인간을 발가벗기도록 결심해야 해. 인간을 죽도록 가렵게 하는 이 미세 동물, 신을 긁어 내기 위해서 말이지. 그리고 이 신과 함께 인간의 기관들도. 글쎄 당신이 원한다면 나를 묶으시오. 하지만 기관만큼 쓸모 없는 것도 없지. 인간을 기관 없는 신체로 만들 때, 그 모든 자동기제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고, 진정한 자유를 돌려줄 수 있게 될 거야. (아코디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열기 넘치는 대중 댄스 홀에서처럼 거꾸로 뒤집어 춤추는 법을 다시 알게 하고. 그럼 그 뒤집은 면이 진짜 앞면이 될 거야.”
_앙토냉 아르토 <신의 심판을 끝장내기 위하여(1947)> 라디오 실험극 중
세계를 뛰노는 순수하고 조악하며 유쾌한 이 존재들에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신체기관이 없다. ‘괴물’로 표상되는 이 기관 없는 유기체들은 연극적 시공간 안에서 인간 규범을 흉내낸다. 태양신의 눈물로 일어난 대홍수를 피해 도망친 이들은 어딘가에 도달하여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외부 세계인 지구를 관찰하고, 플라톤의『국가론』을 읽으며 그들만의 국가를 구상한다. 여기서 이준희는 흙으로 이 괴물들을 빚어 각각의 존재들에게 신체 기관을 부여하고 이름을 호명하며 징벌도 내린다. 마치 신의 놀이를 하듯 새로운 시공간에 이들을 위치시키고 서사를 만든다. 화려하고 찬란한 이들의 연극적 세계는 고개를 돌리자 마자 마주치게 될 현실 세계에 의해 무너질 위협에 처한다. 보편적 인간 이미지로부터 미끄러져 내린, 조악하며 충분히 가부장적이지 못한 이들은 과연 이상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까. 잠시 후 막이 내리고 암전 될 이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는 얼마나 단단한 땅 위에 발을 딛고 있을까.